[신산업·융합에서 길을 찾다] <2부>ICT 격전지 자율차
한발 늦은 한국 스마트카
BMW 제공
BMW 7시리즈에 탑승한 운전자가 손과 발을 뗀 채 도로를 달리고 있다. 차간거리와 속도를 설정하면 최대 15초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급커브길이나 끼어들기 차는 아직 인지하지 못한다. 전방 주시는 필수다.
BMW 제공
BMW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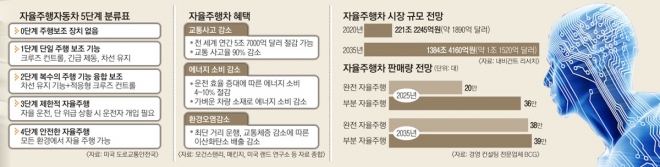
그런데 유독 우리 ICT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디다. 현대·기아차는 우리 기업들이 아닌 애플, 구글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ICT 기업들의 소극적인 움직임, 업종 간 협업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우리 기업들의 ICT 경쟁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뒤늦게 전장사업팀을 꾸려 스마트카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기업 간 융합을 촉진하겠다며 직접 자율주행 협의체를 발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업부가 지난해 말 발족한 자동차융합얼라이언스에는 LG전자, 삼성전기 등 전자분야 대표 기업들과 네이버, KT, 오비고 등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처음엔 6개 기업이 참여했지만 현재는 50여개로 규모가 늘었다. 하지만 이들도 아직까진 업체별로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업체들 간의 협업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 중이다. 중국 최대 검색 업체 바이두는 BMW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가 하면, 이미지 센서로 기사회생 중인 소니는 지난해 일본 로봇 자동차 벤처 기업 ZMP에 1억엔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구글 무인차는 지금까지 약 210만㎞를 달리며 자율주행 선두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구글은 올해 자율주행택시 회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산업 판도 뒤집기에 나선다. 애플은 최근 관련 업체 5곳을 인수하면서 2019년쯤 자체 전기 자율 주행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차량 위치 인식, 주행 상황 인지와 차량 제어 등의 기술은 독일, 일본, 미국 업체들과 격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IT 전자 기업들이 응용과 개발에 나서 줘야 하는데 자동차업계와 비자동차업계가 따로 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정부 컨트롤타워가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미국은 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무 부처만 산업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3곳이다.
명희진 기자 mhhj46@seoul.co.kr
2016-03-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퀄리티 미쳤다” 전국서 우르르…김밥 하나로 대박난 ‘13만 소도시’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0/26/SSC_2025102613214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