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іөнҸ¬кё°м–ө м§ҖмҡёмҲҳ мһҲлҠ” кёё н…„лӢӨвҖҰкё°м–ө мһ¬кө¬м„ұ л©”м»ӨлӢҲмҰҳ к·ңлӘ…
көӯлӮҙ м—°кө¬м§„мқҙ кё°м–өмқҳ мЎ°к°Ғл“Өмқҙ лҮҢ мҶҚм—җм„ң м•Ҳм •м ҒмңјлЎң м ҖмһҘлҗҳкі мһ¬кө¬м„ұлҗҳлҠ” л©”м»ӨлӢҲмҰҳмқ„ л°қнҳҖлғҲлӢӨ. м„ұнҸӯн–үмқҙлӮҳ мһ¬лӮңВ·мһ¬н•ҙ л“ұ мӢ¬к°Ғн•ң м •мӢ м Ғ 충격мқ„ л°ӣмқҖ мӮ¬лһҢл“Өм—җкІҢ лӮҳнғҖлӮҳлҠ” кіөнҸ¬кё°м–өмқ„ мӮ¬лқјм§ҖкІҢ н•ҳкұ°лӮҳ кё°м–өмқҳ мҷңкіЎВ·мң мӢӨ л“ұмқ„ л°”лЎңмһЎмқ„ мҲҳ мһҲлҠ” к°ҖлҠҘм„ұмқ„ м—ҙм—ҲлӢӨлҠ” м җм—җм„ң мЈјлӘ©лҗңлӢӨ.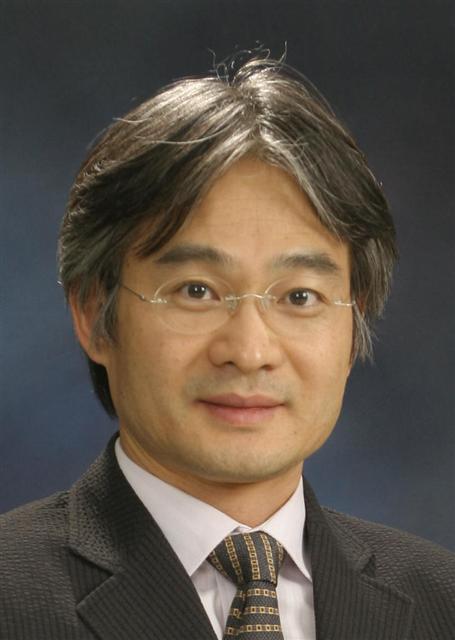
кё°м–өмқҖ мӮ¬лһҢмқҙлӮҳ лҸҷл¬јмқҙ кІҪн—ҳн•ң кІғмқ„ м ҖмһҘВ·мң м§ҖВ·нҡҢмғҒн•ҳлҠ” мқјл Ёмқҳ кіјм •мқ„ кұ°м№ңлӢӨ. м ҖмһҘкё°к°„м—җ л”°лқј мҲҳмҙҲм—җм„ң мҲҳмӢӯ분 мң м§ҖлҗҳлӢӨ мӮ¬лқјм§ҖлҠ” вҖҳлӢЁкё°кё°м–өвҖҷкіј мҳӨлһң кё°к°„ мң м§ҖлҗҳлҠ” вҖҳмһҘкё°кё°м–өвҖҷмңјлЎң кө¬л¶„лҗңлӢӨ. мһҘкё°кё°м–өмқҖ мң м „мһҗ л°ңнҳ„кіј лӢЁл°ұм§Ҳ н•©м„ұмқ„ нҶөн•ҙ мӢңлғ…мҠӨмқҳ кө¬мЎ°к°Җ кіөкі н•ҙм§ҖлҠ” вҖҳкІҪнҷ”вҖҷ(зЎ¬еҢ–) кіјм •мқ„ кұ°м№ҳл©° нҳ•м„ұлҗңлӢӨ. кё°м–өмқ„ лӢӨмӢң л– мҳ¬лҰ¬кұ°лӮҳ м •ліҙк°Җ 추к°Җ, мҲҳм •лҸј м ҖмһҘлҗ л•ҢлҠ” вҖҳмһ¬кІҪнҷ”вҖҷ кіјм •мқ„ кұ°м№ңлӢӨ. м§ҖкёҲк№Ңм§Җмқҳ м—°кө¬м—җм„ң мһ¬кІҪнҷ”к°Җ мқјм–ҙлӮ л•ҢлҠ” мӢңлғ…мҠӨм—җм„ң лӢЁл°ұм§Ҳмқҳ 분н•ҙмҷҖ н•©м„ұмқҙ мқјм–ҙлӮҳлҠ” кІғмңјлЎң м•Ңл Өм ё мҷ”м§Җл§Ң к·ё кіјм •мқҖ лӘ…нҷ•нһҲ л°қнҳҖм§Җм§Җ м•Ҡм•ҳлӢӨ.
к°• көҗмҲҳнҢҖмқҖ кө°мҶҢ(л°”лӢӨлӢ¬нҢҪмқҙмқҳ мқјмў…)мқҳ кј¬лҰ¬м—җ л°ҳліөм Ғмқё м „кё° мһҗк·№мқ„ мЈјлҠ” л°©лІ•мңјлЎң кіөнҸ¬ кё°м–өмқҙ мһ¬кІҪнҷ”лҗҳлҸ„лЎқ н–ҲлӢӨ. к°• көҗмҲҳлҠ” вҖңкө°мҶҢмҷҖ лӢ¬лҰ¬ мӮ¬лһҢмқҖ лүҙлҹ°мқҙ 100м–өк°ң мқҙмғҒмңјлЎң мӢӨм ң м Ғмҡ©к№Ңм§ҖлҠ” л§ҺмқҖ м—°кө¬к°Җ 진н–үлҸјм•ј н•ңлӢӨ.вҖқл©ҙм„ң вҖңнҠ№м • кё°м–өмқ„ мң м§Җн•ҳкұ°лӮҳ м§Җмҡ°лҠ” кіјм •мңјлЎң мқ‘мҡ©н•ңлӢӨл©ҙ мҷёмғҒ нӣ„ мҠӨнҠёл ҲмҠӨ мһҘм• (PTSD)мІҳлҹј кі нҶөмҠӨлҹ¬мҡҙ кё°м–өм—җм„ң л°ңмғқн•ҳлҠ” м •мӢ м§Ҳнҷҳмқ„ м№ҳлЈҢн• мҲҳ мһҲмқ„ кІғвҖқмқҙлқјкі м„ӨлӘ…н–ҲлӢӨ.
л°•кұҙнҳ•кё°мһҗ kitsch@seoul.co.kr
Copyright в“’ м„ңмҡёмӢ л¬ё All rights reserved. л¬ҙлӢЁ м „мһ¬-мһ¬л°°нҸ¬, AI н•ҷмҠө л°Ҹ нҷңмҡ© кёҲм§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