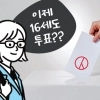서울대 건축학과 전봉희 교수, 공청회서 주장
광화문에 한글과 한자 현판을 모두 달자는 의견이 나왔다.서울대 전봉희 교수는 17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화문 현판 글씨·글씨체 여론수렴 공청회’의 토론자로 나서 “하나의 건물에 여러 현판을 다는 사례는 우리 문화유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건축역사학회 이사이기도 한 그는 새 광화문 현판에 들어갈 글씨와 글씨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글로 쓴 현판을 중앙의 원래 위치에 달고, 예전 한자로 쓴 광화문 현판은 그 아래층이나 뒤쪽 경복궁을 향한 면에 달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윗층부터 각각 미륵전(彌勒殿), 용화지회(龍華之會), 대자보전(大慈寶殿)의 편액을 가진 금산사 미륵전의 사진을 제시하며 “이도 저도 버릴 수 없다면 제3의 대안이 좋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또 광화문이 경복궁의 대표문이라는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도로’로서 현재 가치를 고려할 때 한글 현판을 살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00년대 초 황토현에서 숭례문으로 이르는 도로가 닦여 광화문 사거리가 만들어진 후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을 지나 숭례문으로 이르는 도로는 대통령의 국장을 비롯한 국가 행사의 중심에 있었다”며 “광화문의 현판을 과거 중건 때의 것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은 광화문이 갖는 오늘날의 의미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각층 전문가, 언론인, 학생 등이 모인 이날 공청회의 발제는 진태하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사장과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가 맡았다.
진 이사장은 광화문이 중건된 시기 임태영의 서체로 쓰인 한자 현판을 광화문에 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대한 국고를 들여 광화문을 복원한 이유는 경복궁 근정전과의 방향을 바로 맞춰 1864년(고종1년)의 모습을 되살리려는 것이었다”며 “이것이 광화문 만의 복원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화문은 ‘임금의 덕이 햇빛처럼 온 세상에 미치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철학과 사상이 깃든 명칭”이라며 “’광화문’을 한글로 써놓고는 그 뜻을 말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대로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는 우리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한글 현판이 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광화문을 다시 짓고 친필 휘호로 한글 현판을 쓴 것이 세종의 정신과 업적을 되살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었다”며 “그 바탕에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불꽃처럼 일어났던 것을 모르고 한글현판을 뗀 것은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광화문 한글현판은 군사독재 유산이 아니라 한글을 빛내자는 한글단체의 끈질긴 주장에서 나온 한글 역사의 유적”이라며 “꼭 박정희 전 대통령 글씨가 아니더라도 세종 때의 훈민정음체로 쓴 한글 현판을 다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토론자로 나선 홍찬식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당초 복원 사업의 취지가 일제 강점기 때 변형 훼손된 경복궁을 그 이전 모습으로 되살린다는 것이었다”며 “1888년 시절의 경복궁과 광화문을 복원한다는 전체 사업의 취지에 맞춰 ‘한자 현판’이 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동열 중앙대 교수는 “한글이 이미 그 기능이나 아름다움을 통해 이미 전 세계에서 호응을 받았고 이미 국제어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우리말로 적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정필준 학생은 “문화재 복원사업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의 원칙대로 관련 학계와 전문 기술 보유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손수호 국민일보 논설위원, 선주선 원광대 교수, 이훈 한양대 교수, 갈주성 세종대 학생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각각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문으로 쓴 기존 현판글씨는 2005년 4월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에서 고종 당시의 현판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리원판 사진에 포착된 자료를 토대로 경북궁 중건 당시 임태영 훈련대장의 글씨를 디지털로 살려낸 것이다.
이렇게 복원된 현판은 2010년 광복절에 복원 준공된 광화문에 걸렸지만 균열이 생겨 논란 끝에 다시 제작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현판 교체가 결정되자 한자가 아닌 한글로 바꿔야 한다거나, 현대 저명 서예가의 글씨로 대체하거나 혹은 옛 글씨에서 집자(集字)해야 한다는 등 여러 주장이 각계에서 나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며 현판제작위원회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