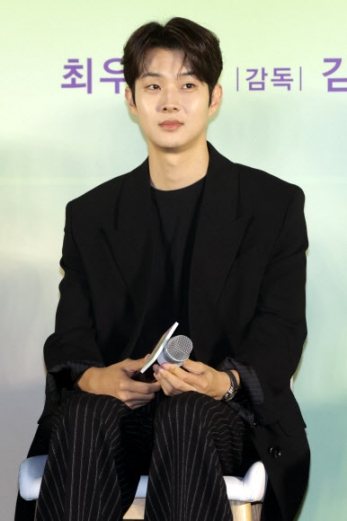되찾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실은 죽음과 같다. 그러니까 상실한 다음에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애도의 과정이다. 애도는 사라진 대상을 위한 진혼이자, 남은 자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의식이기도 하다. 도요시마 게이스케 감독의 연출 포인트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도쿄에서 생활하다 귀향한 마리(기쿠치 아키코)는 빙수 가게를 연다. 일손을 돕는 사람은 마리의 집에 잠시 의탁 중인 하지메(미네 아즈사)다. 두 여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다. 도쿄에서의 삶은 마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 내 재산 분쟁 탓에 이곳으로 피신한 하지메도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빙수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서, 바다에서 함께 헤엄치면서, 한집에서 먹고 자면서 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회복해 간다. 극적인 위로나 치유의 순간은 없다. 각자의 애도는 담담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장면들은 당밀맛·귤맛만 파는 마리 가게의 빙수 메뉴처럼 심심하다. 단출하지만 정성 들여 만든 깊은 맛이 난다는 뜻이다. 애도를 잘한다고 흉터가 안 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실한 애도를 하고 나면, 흉터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어느 누구도 상처 없이 살기는 불가능하다.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아문 흔적을 간직한 채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슬픔이 솟구치는 바다의 뚜껑이 닫힌다.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