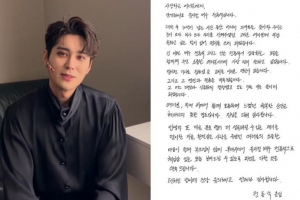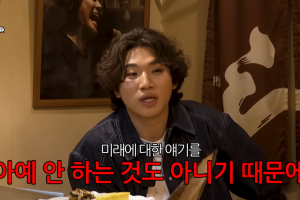이달 개봉 외화 44편 중 한자 언어권인 일본 및 중국 영화 13편을 제외하면 순수 한국어 번역 제목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사랑에 빠질 확률’(Medianeras) 등 5편에 그친다.
앞서 개봉한 영화들도 마찬가지다. ‘송 포 유’(Song for You), ‘실버라이닝 플레이북’(Silver Linings Playbook), ‘애프터 어스’(After Earth), ‘테이크 쉘터’(Take Shelter) 등 예는 무수히 많다. 원제를 그대로 옮기는 것도 아니다. ‘마스터’(The Master)나 ‘킬링 소프틀리’(Killing Them Softly), ‘사이드 이펙트’(Side Effects)처럼 관사나 목적어, 복수형은 생략되기 일쑤다. ‘섹슈얼 어딕션: 꽃잎에 느껴지는 쾌락과 통증’(Pleasure or Pain)이나 ‘아메리칸 오지’(A Good Old Fashioned Orgy), ‘테이크 다운’(Welcome to the Punch)처럼 원제와는 다른 영어 제목을 억지로 붙인 경우도 있다. ‘월드 워 Z’(World War Z)는 ‘세계대전 Z’라는 원작 소설이 알려져 있는데도 굳이 영어 제목을 썼고, ‘레드: 더 레전드’(Red 2)는 원제에도 없는 영어를 덧붙였다.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면 영어 원제를 유지하는 것이 영화계의 분위기”라는 한 영화 수입사 관계자의 말처럼 영어 제목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 이유가 뭘까. 영화 수입사에서 꼽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작품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미리 알려졌거나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우 원제가 가지고 있는 후광 효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영화의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좋은 한국어 제목을 떠올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영화 수입사 관계자는 “‘제목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쉽고 명확하게 관객에게 기억되느냐인데 이미 알려진 원제를 바꿀 경우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외화마다 적게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한국어 제목 안을 내지만 원제의 느낌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우디 앨런 감독의 ‘Vicky Cristina Barcelona’가 막장 드라마 느낌의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로 바뀌면서 두고두고 영화 팬들에게 비판받았듯 “괜한 한국어 제목은 안 만드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윤성은 영화평론가가 “원제를 번역하면 영화의 느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관객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이 콜론(:)을 사용해 부제를 다는 방식이다.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Now You See Me), ‘포가튼: 잊혀진 소녀’(Forgotten)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는 ‘해리 포터’ 시리즈처럼 작품이 여러 편으로 이뤄진 경우 각 편을 구분하기 위해 쓰였지만 지금은 ‘레드: 더 레전드’에서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추세다. 한 영화 수입사 관계자는 “원제를 살리면서 원제의 불명확한 의미도 부연하는 방식”이라면서 “10~40대까지 다양한 영화 관객을 타깃으로 삼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어 제목이 ‘대세’로 굳어진 상황에서도 좋은 한국어 제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영화 팬들이 적지 않다. 이용철 영화평론가는 “원제를 한국어로 직역한 것도 반드시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파리는 안개에 젖어’(La Maison Sous Les Arbres·1971)처럼 한국어를 사용하면서도 영화의 의미와 느낌을 살리는 것이 좋은 제목”이라고 말했다.
허남웅 영화평론가는 “‘세상의 끝까지 21일’(Seeking a Friend for the End of the World) 정도를 제외하면 올해 괜찮은 번역 제목은 찾기 어렵다”면서 “수입사에서는 영어 제목을 쓰는 것이 세련됐다고 여기는 것 같지만 번역 제목을 붙인다고 해서 관객들이 볼 영화를 안 보거나 안 볼 영화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