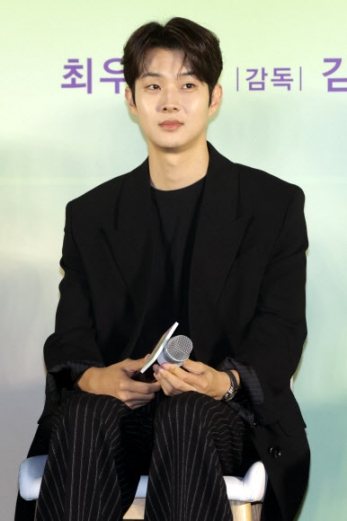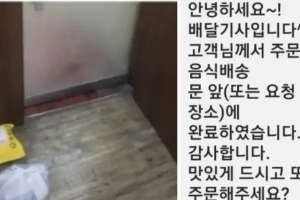‘시네마 베리테’는 리얼리티 TV쇼의 본격적인 시작점을 되돌아본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연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는다는 생각은 다큐멘터리 진영에서 오래 전부터 시도됐던 바다. 지가 베르토프(1896~1954)를 거쳐 장 루슈(1917~2004)가 이끌었던 그러한 다큐멘터리의 전통은 시네마 베리테로 불린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제작자 크레이그 길버트는 시네마 베리테와 TV쇼를 결합해보기로 한다. 인류학자가 원시 부족을 연구해 논문을 내놓듯이 길버트는 카메라로 미국 가족을 관찰해 시청자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그가 TV쇼의 대상으로 선택한 라우드 가족에게 약속한 것은 ‘계몽과 실험’이었다.
‘아메리칸 패밀리’라 이름 붙여진 TV쇼의 주인공은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에 사는 라우드 일가족. 그들의 일상을 수백 시간에 걸쳐 기록한 필름은 12회 분량으로 편집돼 PBS에서 방영됐다. 1973년 당시 시청자들은 ‘아메리칸 패밀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사적으로 묻어둬야 할 모습을 세상에 공개한 라우드 가족을 바보로 업신여겼고 방영 이후 의도하지 않게 괴물로 취급당한 라우드 가족은 다시 TV에 출연해 처지를 밝히고 편견과 싸웠다. 제작진이 드라마 전개에 개입한 게 문제의 발단. 방송국은 가족이 나누는 일상의 대화보다 가족의 갈등, 비밀, 이혼 따위의 선정적인 내용을 추구했고 시청률을 높이려고 멋대로 편집해 진실을 왜곡했다.
감독 샤리 스프링어 버먼과 로버트 풀치니는 대표작 ‘아메리칸 스플렌더’(2003)에 이어 TV를 도마 위에 올린다. ‘아메리칸 스플렌더’에서 실존 인물 하비 피카는 토크쇼에 나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더욱 관심을 끈다. TV 프로그램은 기형적인 존재다. 진실은 사라진 지 오래고 기괴한 짓거리로 주목받으려고 안달인 정신병자들이 매일 TV에 등장하며 방송국은 호기심 끌기에 혈안이 돼 싸구려 볼거리를 주워 모은다. ‘시네마 베리테’는 리얼리티 TV쇼의 순수가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변질했다고 말한다. 반면 가수 돈 헨리는 ‘더러운 세탁소’라는 노래에서 더러운 소식에 열광하는 대중을 비꼬았다. 주기에 받아먹는 걸까, 원하기에 주는 걸까. 순수가 죽은 자리에 더러움만 가득하다는 사실 외에 무엇이 답인지는 모른다. TV 영화로 제작된 ‘시네마 베리테’는 한국에선 홈비디오로 출시됐다.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