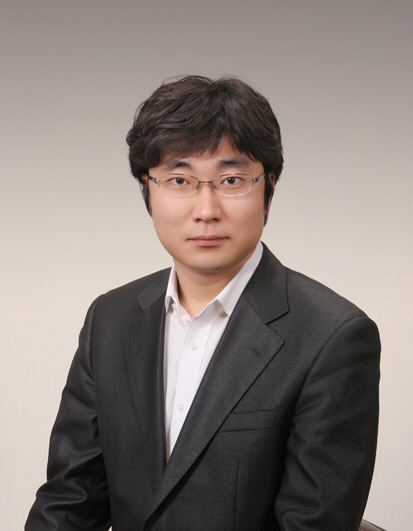
이영준 사회부 기자
학교 폭력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실질적인 위해 사례다. 그런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따라서 이 조례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약(藥)이어야 옳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거나 “교사에게 학교 폭력 예방 책임이 있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실체와 사뭇 다르다. 한사코 교사와 학생을 대립 구도로 이해하려 한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권위까지 부인하려 든다. 복장·두발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유리한 조항만 골라서 보기도 한다. 교권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학생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학교 폭력이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조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모두의 눈’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만 조례를 해석한 결과다.
여타 법률이 그렇듯 학생인권조례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약발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원칙과 현장성을 조화시키면 학생들을 학교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학교 폭력의 뿌리를 더 깊게 할 수도 있고, 학교를 교사와 학생 간 전쟁터로 만들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는 교육 주체들의 시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핵심은 이 조례가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 주체를 위한 권리장전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기본권적 권리는 어떤 이해보다 앞서지만 거기에는 무거운 책임도 따른다. 그런 정신을 이해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간명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apple@seoul.co.kr
2012-02-1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