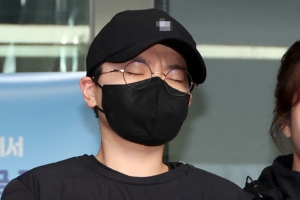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세모자’ 母 “아이들 성폭행 당한 것은 모두 사실”


세모자 사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여)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성폭행 및 성매매 강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속인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황당하다. 죄가 있다면 무속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정 얘기를 들은 것 밖에 없다.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남편과 시아버지 간 재산분쟁에 따른 불안감으로 이씨가 김씨를 믿고 따른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도 재산분쟁과 관련해 이씨에게 허위고소를 조장했다는 공소사실에는 무리가 따르고 모두 김씨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김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 없다.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고 다른 관련자들을 고소한 것은 “모두 남편과 짜고 김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라며 김씨가 사주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피해자인 아이들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성폭행 고소사건 피해자인 친정식구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씨에게 유죄 판결을 한다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의 친정 가족은 구형 후 법정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무속인 김씨의 말 믿다가 이씨의 재산이 많이 김씨에게 넘어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이씨는 정신과적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충격적인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김씨는 이씨를 배후 조종해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46)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대 아들 2명(18세·14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다.
이씨는 2014년 9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에게도 5∼6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 달 뒤 서울의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목사인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 오빠, 올케, 언니, 형부를 비롯해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까지 모두 4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6월에는 유튜브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육성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올려 “남편의 강요로 20년 결혼생활 동안 1천명에 달하는 남자를 상대했고, 아들들도 300명 넘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 등 세모자가 범행 시기나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이씨를 무고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무고 사건 배후에 김씨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고소사건이 허위라고 판단해 이씨와 김씨를 구속했다”며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가 김씨 소유로 변경된 정황을 포착해 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