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죽음 사이에서 헤매다
사람은 왜 죽는 걸까. 애나(크리스티나 리치·왼쪽)의 질문에 엘리엇(리암 니슨·오른쪽)은 답한다. 그래야 삶이 소중해지기 때문이라고.

초등학교 교사인 애나는 변호사인 폴(저스틴 롱)과 사랑하는 사이지만 삶의 행복을 만끽하기보다는 우울증에 시달린다. 애나는 어느날 폴이 청혼을 하려고 만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해 때문에 크게 다툰다. 혼자 빗길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그녀는 시신 안치대에서 눈을 뜨게 된다.
장의사 엘리엇은 애나가 이미 죽은 상태라며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고 충고하고, 당황한 그녀는 자신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며 시체실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주사약, 끊어진 전화선, 엘리엇의 벽장에 붙은 수많은 사진들, 엘리엇의 묘한 미소와 미심쩍은 행동…. 애나 본인은 물론, 관객들까지 헷갈릴 정도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과연 그녀는 살아 있는 것일까, 죽은 것일까.
삶을 주장하는 애나와 죽음을 주장하는 엘리엇의 충돌이 영화의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유지한다. 미스터리 스릴러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탓에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식스 센스’와 같은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마무리가 약하다. ‘식스 센스’가 성공을 거뒀던 까닭은 브루스 윌리스가 열연한 말콤 박사가 유령이라는 사실을 관객들이 막판까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애프터 라이프’는 애나가 숨졌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렵다고 말하지만 사는 게 더 두려운 거다.”, “그렇게 붙잡을 만한 삶이었나?” 등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무엇인가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며 드라마적인 요소를 집어넣지만 흡족한 수준은 아니다. 관객의 입장에 따라 결말을 놓고 애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엘리엇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정반대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점은 흥미롭다.
1996년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미를 장식하며 사랑받았던 영국 록밴드 라디오헤드의 ‘엑시트 뮤직(포 어 무비)’가 ‘애프터 라이프’의 마지막을 감싸며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영국 출신 베테랑 배우 리암 니슨의 연기는 여전하다. ‘애덤스 패밀리’, ‘꼬마 유령 캐스퍼’의 아역스타 출신으로 이제는 성인 배우가 된 크리스티나 리치가 과감한 노출 연기로 열연을 펼친다. 폴란드 출신 아그네츠카 보토위츠 보슬루 감독의 첫 상업 장편영화. 103분. 15세 이상 관람가. 9월 2일 개봉.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0-08-31 2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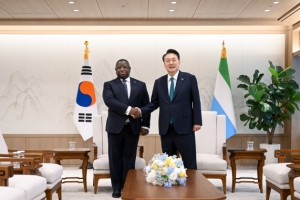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