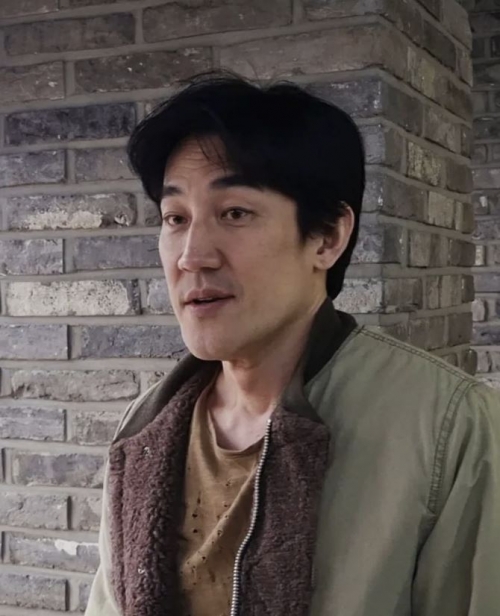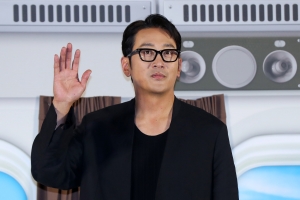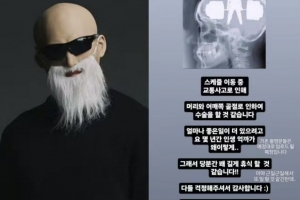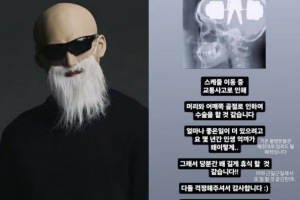“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영화 ‘벌새’는 관객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선생 영지(김새벽 분)가 제자 은희(박지후 분)에게 보낸 편지의 첫 문장이기도 하다. 그 답을 누가 알까. 몽테뉴? 톨스토이? 이들의 견해는 참고할 만하지만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각자 처한 조건―시대와 환경이 달라서다. 예컨대 ‘인간성을 지켜 내라’는 몽테뉴의 조언은 어떤가(인간성에 대한 정의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겠으나, 여기서는 쉽게 ‘선(善)’이라고 규정해 보자). 자기를 마구잡이로 때리는 오빠를 둔 은희에게, 그런 오빠의 폭력을 고발해도 “너희 제발 싸우지 좀 마”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부모를 둔 은희에게 인간성을 지켜 내라는 격언이 와닿기나 할까.
이럴 때 성현의 가르침은 공허해진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은데 혼자 선을 추구하는 순간 나는 호구가 되기 때문이다. 추상적이기만 한 인생론은 쓸모없다. 그것은 현실적 맥락에 바탕을 둬야 실효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점에서 ‘벌새’는 스스로의 상황에 맞춰 써 나가는 은희만의 인생론이라 할 만하다. 함께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친구가 문구점 주인에게 은희의 신상 정보만 털어놓을 때 느끼는 배신감, 은희에게 좋아한다고 매달려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심하는 또래들에게 느끼는 허탈감. 도무지 인간성을 지켜 내기 힘든 과정을 맞닥뜨리면서 열네 살 은희는 1994년 강남을 살아간다.
그렇지만 은희에게 나쁜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은희는 한문 학원에서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 주는 강사 영지를 만났다. 선생이라도 섣불리 학생에게 충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지의 좋은 점이다. 은희의 입장에서 오래 깊이 생각한 다음 영지는 이야기한다. “누구라도 널 때리면 어떻게든 맞서 싸워.” “우울할 땐 손가락을 움직여 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그래도 이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말에 담긴 메시지가 아주 특별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은 은희에게 특별하게 다가온다. 마음을 담은 커뮤니케이션이어서 그렇다. 은희로서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받아 본 적 없는 ‘선’이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여겼던 감정을 직접 느끼면서 은희의 인생론은 새로 쓰인다. 영지를 통해서만은 아니다. 인간 말종인 줄로만 알았던 오빠와 아빠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은희가 발견했을 때, 평소 순종하던 엄마가 아빠에게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배신자로 치부했던 친구가 “우리 오빠처럼 문구점 아저씨가 때릴까 봐 너무 무서웠어”라고 고백했을 때가 그랬다. 은희는 ‘선’이 아니라고 간주했던 주변인을 다시 평가한다. 그들은 나만큼이나 이상하고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존재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당신, 당신 같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은희의 인생론이 우리를 비춘다.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