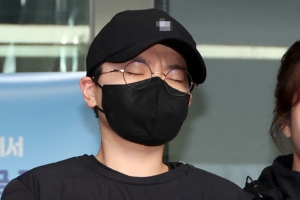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맞벌이 가정은 이미 할머니 찬스, 할아버지 찬스는 물론 고모, 삼촌, 이모 찬스까지 모두 소진한 지 오래이다. 지난 5월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고 대답한 여성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10%로 나타났다. 설상가상 여성노동자의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돌봄노동은 60%나 더 증가했다고 한다.
추석을 지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있다. 영 멈춰 서 있던 방과후 수업도 기지개를 켜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방과후 수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1학기에도 방과후 수업 신청만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모두 없었던 일로 됐던 경험들 때문이다. 즉 학생들의 보호자들은 학교에 가는 지금의 상황이 며칠 안에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A에게는 명문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지인 B가 있었다. A의 이야기를 듣던 B는 “코로나랑 학교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되물었다. B의 아이는 A의 아이와 같은 나이인데, 이미 개학 후 일주일 정도 적응기를 거쳐 ‘실질적 대면수업’이 온라인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자세히 물어보았단다. B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학기 초에 디지털로 학생들이 연결되고 참여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아이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장시간 집중이 어려운 온라인 수업인지라 일방적 강의 수업은 전면 폐기하고 아이가 스스로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체육이나 음악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소수 정예 그룹과외 방식으로 진행돼 아이들이 더 좋아한단다. A는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며 듣다가 ‘같은 나라 다른 세상’이라 정신승리하는 것으로 시끄러운 속을 달랬다 한다.
공교육에 아이를 맡긴 대부분의 보호자는 그런 명문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기대하진 않는다. 그저 공교육 아래 안전한 ‘돌봄’, 그리고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성’이 적절히 발달하는 정도가 소박한 바람이라면 바람이다. 제대로 된 돌봄과 적절한 사회성 발달은 ‘일관성’이 핵심이지만, 지난 학기 널뛰듯 들쭉날쭉한 등교 상황은 일관성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었다. 임시 대책으로 ‘등교인원 제한’이 시행됐지만, 코로나 시대임에도 재택근무는커녕 근태 평가를 더 삼엄하게 당하는 수많은 노동자는 아이가 아예 등교하지 않는 상황보다 퐁당퐁당 등교하는 상황이 더 고통스럽다.
코로나19 아래 공교육은 맨몸 그대로를 드러냈다. 교육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돌봄 기능과 사회성 발달도 내팽개친 형국이다. 학생 없는 텅 빈 학교를 매일 방역하고 서류 만들고 출입 금지하는 사이, 2020년 1학기는 아이들의 기억에서 지워졌다. 한 반에 고작 20명 남짓인데 한 학기 내내 선생님의 전화 한 통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아이, 학원은 다 가는데 왜 학교만 못 가는 거냐고, 또는 학교는 대체 왜 가는 거냐고 묻는 아이에게 그 이유를 쉽사리 대답할 수 있는 보호자는 드물다.
7개월이나 공적 교육체계가 학생을 가정에 떠넘기는 것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니다. 무능이고 무책임이다. 방역을 이유로 아이들을 방치하던 1학기를 거부한다. 이제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옵션일 뿐’, ‘기왕 망하려면 확실히 망해야 한다’ 등 공교육을 향한 원망 섞인 자조로 관망하기에는 아이들의 현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2020-10-1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