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별세’의 사전적 의미는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이다. 일상의 의미 또한 다르지 않지만,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기사들에서 ‘별세’는 가장 흔하게 보인다. 죽은 사람이 모두에게 ‘윗사람’인 것은 아닌데도 이렇게 알린다. 그것도 모두에게 쓰이는 건 아니고 나이가 있고, 살아생전 지위가 있었던 이들에게 주로 사용된다.
사회적으로 큰 업적이나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는 ‘별세’라는 말이 작아 보인다고 여기는 듯하다. 언론은 특별해 보이는 이들의 죽음을 ‘타계’라고 기록한다. ‘별세’보다 ‘타계’가 한 단계 위이듯 사전의 풀이도 달라 보인다. 사전은 ‘타계’를 ‘귀인(貴人)의 죽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한다. 대통령이나 교황이 사망했을 때는 또 다르다. 이때 언론들은 주로 ‘서거’라고 붙여 왔다. 이들의 죽음은 더 다른 무엇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죽은 몸을 가리키는 말들에도 구별과 차별이 있다.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는 ‘시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고유어를 써서 ‘주검’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이의 죽은 몸은 ‘시신’이라고 높여 가리킨다. 어떤 ‘유골’들은 높여서 ‘유해’라고 한다. 때로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이의 ‘시체’에도 ‘유해’라고 표현한다. 더 대접하고 싶어 하는 태도가 있다.
죽음은 종교별로도 다르게 나타난다. 불교에서는 ‘입적’이나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소멸된 상태’를 뜻하는 ‘열반’이다. 개신교에서는 ‘하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간다’는 뜻으로 ‘소천’이라고 한다. 가톨릭에서는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 일’의 의미로 ‘선종’이라고 한다. 천도교에서는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환원’이라고 부른다. 모두 종교적 시각이 담겨 있다. 낯선 말들이지만 언론매체들은 대부분 그대로 전달한다. 이보다는 쉽고 일상적인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2020-10-19 2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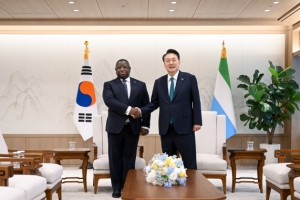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