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신문을 통해 본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큰 사건에서부터 지방 소도시의 우수 자치 행정 사례까지, 국정원과 관련된 최근의 논란에서 문화·예술계의 동향까지. 매일 아침 신문은 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건들을 나의 삶으로 배달해 주었다.
그리고 이 ‘앎’은 나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사회 저편의 사람들까지도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했다. 공동체는 나의 경험과 앎에 의해 경계지어진다. 루소는 이러한 현상을 ‘연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 받는 타인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켜 볼 수 있는 상상력, 즉 연민의 능력을 갖는데, 이 연민의 한계가 사회의 경계라는 것이다. ‘나’라는 개인은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의 특정 공간에서 한정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신문은 나에게 보이는 사회를 넘어 내가 속한 더 큰 공간의 형태를 포착하고 그 경계를 확정지음으로써 나에게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얻은, 나 이외의 것에 대한 앎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연민을 가능하게 한다. 연민이라는 능력 덕에, 우리는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형 할인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찾기도 하고, 대리점주에 대한 갑의 폭력에 분노하며 따뜻한 사연에 눈물지을 수도 있다.
이처럼 모든 이가 서로를 연민하고 서로와 연대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우리의 연민은 아직까지는 지각할 수 있는 범위까지밖에 미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일에 분노할 수 없고, 공동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언론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나온다. 어떤 사안을 어느 범위까지 보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연민의 한계는 달라지고, 사회의 경계 역시 달라진다.
신문이 그 역할을 넓혀감에 따라 공동체 의식 역시 확장되고 있다. 연민의 범위는 지구촌으로 넓어지는 동시에 성겨져, 그 사이로 사람들이 자꾸만 흘러내린다. 대한문의, 시청 농성장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지만 연민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사회 주변부의 이들은 계속해서 경계 밖으로 밀려나가, 이들이 설 곳은 좁디좁은 철탑 위밖에 남지 않았다. 인식이 연민의 한계를 결정하고, 사회의 경계를 만든다. 언론의 철저한 무시 속에서, 어떤 이들은 국가의 일원이 분명함에도 국민이 아니게 된다. 내가 요즘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까닭 모를 무서움은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다시 지난 1년을 돌아본다. 신문은 많은 사건들을 내 삶 속으로 배달해 줬지만 동시에 알아야 할 어떤 사건들은 길에 흘리고 오기도 했다.
신문을 통해 내 연민의 경계는 저 멀리까지 확장되기도 했지만 연대를 필요로 하는 곳에까지는 미치지 않기도 했다. 옴부즈맨으로서 신문의 구석구석은 살펴봤지만 신문이 말하지 않은 사회의 구석진 곳은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나의 활동에 대한 반성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신문의 반성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2013-07-03 3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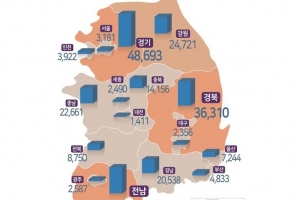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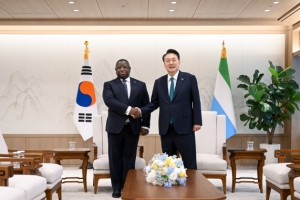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