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희 체육부 기자
스포츠판에 와 보니 종목을 가릴 것 없이 많은 기자들이 트위터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기사로 미처 풀어내지 못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 주거나 팬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물어봐 주기도 하면서 독자와의 소통 창구로 트위터를 톡톡히 활용했다. 트위터를 통해 트렌드도 접하고 기사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 나로서는 반가운 일이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 양상이 좀 달랐다. 일부 기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유명 선수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프로필에는 당연히 그 선수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올라 있다. 선수들과 의미 없이 나눈 잡담도 일일이 트위트한다.
선수들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팬들은 당연히 이런 기자들을 팔로하고, 팔로어가 늘어나면 이 기자의 지명도도 덩달아 확장된다. 때로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쓰지 않고 먼저 트위터에 올리거나, 자신이 쓸 기사에 대해 은근히 ‘떡밥’을 날리는 경우도 봤다.
이건 좀 아니다. 스포츠판이라고 해서, 소셜미디어 트위터라고 해서 저널리즘의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건 아닐 터다. 취재원과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게도 지내지 말라는 룰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다. 기자는 취재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호가호위하는 자리도 아니다. 기자는 무엇보다 기사로 말해야 한다는 건 선배들로부터 배운 철칙 중 하나다. 트위터에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같은 일을 하며 밥벌이를 하는 동료를 비판하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다.
haru@seoul.co.kr
2011-07-16 2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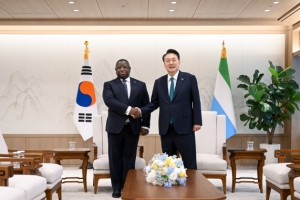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